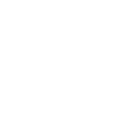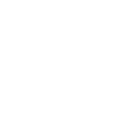구스타프 갤러리(Atelier Gustave) - ‘한국의 결 (Gyeol de Corée)’
2022.10.13
본문
박종용 내설악백공미술관장은 자신을 붓을 든 사람이라 말하지만, 그가 만드는 그림의 완성은 붓끝이 아닌 흙과 바람, 햇살이 마무리 짓는다.
작품의 운명을 정하는 건 자연이다.
수십 년간 ‘흙의 그림’을 고집해온 박 관장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영역을 묵묵히 예술로 일궈낸 작가다.
“내가 붓을 들어도, 터뜨리는 건 자연”이라는 그의 말은 예술과 운명, 그리고 기다림의 철학을 담고 있다.
결(結), 사물의 말과 시간의 흐름
박종용 작가의 작품 세계는 ‘결(結)’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된다. 나무의 결, 돌의 결, 흙의 결, 그리고 시간의 결까지.
그는 “결이라는 건 사물의 말"이라며 "안에 켜켜이 쌓인 본성, 성질, 흐름 같은 것인데, 저는 그걸 눈에 보이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붓으로 점을 찍는 순간, 그림은 시작된다. 하지만 작품이 완성되는 시점은 그의 손을 떠난 후다.
그것에 대해 박 작가는 “햇빛, 그늘, 바람 같은 자연의 요소가 각각 다르게 작용하면서 흙이 스스로 갈라진다"라며 "그 갈라짐, 그 결이 바로 작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흙, 단순한 재료를 넘어선 ‘동반자’
박 작가의 작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흙을 주된 재료로 쓴다는 점이다.
그에게 흙은 단순한 안료가 아닌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다.
그는 흙에 대해 “오래 쓰다 보니 이제는 흙의 성질을 알겠다"라며 "금이 가는 방향과 흙이 마르는 정도 등은 통제할 수 없지만, 기다릴 줄은 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의 작업에는 인위적인 색채 대신 흙의 원색이 그대로 담긴다. 그는 “자연색 그대로의 흰색이 가장 순수하고 깊다. 변하지 않고 고급스럽다"라며 "흙이 가진 색 중 가장 완전한 색"이라고 말했다.
우연이 빚어낸 정교한 예술
그의 그림은 흙이 저절로 갈라지는 순간에 완성된다.
박종용 작가는 작품활동에 대해 “제가 하는 건 점을 찍는 것뿐이다"라며 "그 이후는 자연의 몫이다.
흙이 말라가며 생기는 균열, 예측할 수 없는 그 흐름이 제 그림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연에 몸을 맡기되, 그 우연을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최소한의 개입, 그러나 수십 년의 훈련과 통찰.
그의 예술은 그런 균형 위에 놓여 있다.
오랜 외면,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길
그가 처음 이 ‘흙의 그림’을 선보였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오히려 외면당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고, 계속 이 결을 밀어붙었다.
결국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세월이 만든 것"이라고 덤덤하게 답했다.
십수 년의 무명끝에 그는 한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제 그는 ‘흙의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1980년대부터 일본과 꾸준히 교류해 온 박 작가는 이번 여름, 다시 일본 무대에 선다.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일본 미쓰비시 계열 백화점에서 개인전을 연다.
그는 일본 개인전에 대해 “이번 전시는 전부 흙으로 만든 흰색 계열의 작품들만 가져간다"라며 "‘결’이라는 주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간 다져온 미감과 철학이 국경을 넘어 관객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에게 예술 철학을 묻자,“이건 철학이라기보단 제 생명이고, 제 운명이다.
저는 그냥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의 인생도 흙의 결처럼 마르고, 터지고, 쌓이며 지금의 형상을 만들어왔다.
예측할 수 없기에 더 아름다운 인생의 육각형. 흙과 결, 그리고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박종용 관장은 오늘도 묵묵히 점을 찍고 있다.